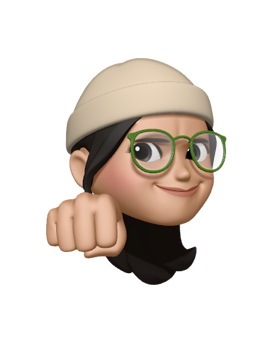|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 이집트
- 프랑스
- 이탈리아
- 오스트리아
- 바로크
- 면접
- deutschland
- Germany
- nassella tenuissima
- 털수염풀
- 프랑스식정원
- 고고학
- 덴마크
- 올덴부르크
- copenhagen
- federgras
- 비엔나
- 바로크식정원
- café merlin
- cornus kousa 'satomi'
- 독일
- wisteria floribunda
- 로로동도롱
- angelshaar
- 고대이집트
- 코펜하겐
- 서프라이즈북
- Denmark
- Wolfsburg
- 펄소리
- Today
- Total
Hey Hayes
자연경관의 상업화도 "환경정의" 개념 안에 함께 고려되어질 수 있는가? 본문
자연경관은 점점 상업화 그리고 상품화 되어가고 있다. 가장 전형적인 예시로 오로라를 떠올려 보자. 누구나 살면서 한번 쯤은 오로라를 보러 떠나는 것을 꿈꿔 보았을 것이다. 자연의 희소성 때문인지 오로라가 갖고 있는 형상이 보편적으로 뛰어난 심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인지 또는 비싼 값에 비례하여 상승하는 경험의 이상화 때문인지 혹은 이들이 모두 상호작용한 결과인 것인지 오늘날의 사람들은 열심히 노동한 댓가를 노르웨이나 캐나다로 오로라투어에 지불하고 이상화된 자연의 경험을 산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몇천만원의 돈을 지불하고 남극으로 가는 배에 오르기도 한다. 대부분의 시간을 배에서 보냄에도 불구하고 남극 땅에 발을 디딛는 그 순간과 남극의 야생동물과의 조우라는 가치는 그 터무니 없는 값을 지불한다.
관광산업이 발달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스위스과 같은 나라들이 상업화한 자연경관을 보러 지구 반대편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기도 한다. 한국에서 이탈리아로 날아온다면 한국인들의 휴가는 왕복 24시간의 비행이 필수요건이 된다. 그들은 어떤 동기로 그들의 노력, 시간 그리고 노동의 댓가를 흔쾌히 지불하게 되는 것일까? 종종 여행은 소모되는 시간과 물리적 거리의 차이로 소풍과는 다르게 정의 되어진다. 왜 여행을 가는 것일까? 여행이란 무엇일까? 일상적 경관을 떠나 낯선 경관을 마주할 때 일종의 해방감을 느끼기 위한 것일까? 고된 노동의 보상으로 자신에게 돈을 지불함에서 오는 보람일까? 또는 값에 비례하는 경험을 이용한 과시욕일까? 1년에 한번 여행을 부추기는 상업적 집단의 소행일까? 아니면 여행이라는 사회문화적 현상이 유행하는 것인가? 누구나 좋아하는 여행은 누구나 좋아하게 의도된 사회적 구조인가?
여행은 늘 낭만적인 경험을 준다는 공식은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화된 풍경에 그들의 생명인 돈과 시간을 기꺼이 지불한다. 여행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풍경이라는 경험은 왜 여행이 되었을까? 여행은 공간의 변화이며 날씨의 변화와 함께하면 더욱 극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나의 경험에 기반하여 - 독일인들은 낮은 위도의 따뜻한 이탈리아로 떠나 공간의 변화를 주고 한국인들은 (특히 겨울에) 무더운 여름의 날씨의 동남아로 떠나며 공간과 계절에 뚜렷한 변화를 준다.
여행을 공간의 변화라는 하나의 조건으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공간의 변화라는 수단으로 풍경이라는 경험을 하는 것이 여행이라고 전제한다면 여기서 "풍경이라는 경험"을 더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이러한 종류의 경험은 "경관경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개념화 될 수 있다. 경관경험은 개인에게 어떻게 인지되고 경관경험의 사회적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또한 자세히 다뤄져야 한다.
상업화된 경관은 "여행"으로 포장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한다. 상대적 약탈감을 발생시킬 뿐 만 아니라 실제로 상업화된 경관에 대한 접근성에 문제도 일으킨다. 경관경험은 점점 더 상품화되어지고 그 상품은 이익집단의 도구가 되어 자연경관을 품은 도시의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구조도 변화시킨다. 특히 상품화된 경관경험이 주는 도시의 이익과 경관경험에 대한 접근성 또는 경관의 상품화 정도와 접근성의 상관관계는 레퍼곡선을 그릴 것이다. 상업적이지 않은 자연경관은 일상을 벗어난 특별한 경험의 가치를 부추기지 않기 때문에 도시의 사업수단이 아닐 것이고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사회적 인프라만 갖게 된다. 즉 경관에 대한 접근성은 관광산업도시에 비해 낮을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나아가 곡선의 정점에서 보면 도시의 이익을 위해 점점 더 상품화된 자연경관은 가장 높은 접근성을 갖는다. 이익집단들의 적극적 활동들은 자연경관을 통해 도시의 사회 문화적 인프라를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곡선의 후반부는 반대의 결과를 보인다. 과도하게 상업화된 자연경관은 경험가치에 비례할 만큼 비용이 이상적이지 않게 되거나 과도한 상업성이 경관의 미를 헤쳤거나 또는 경험가치와 경험비용의 동반상승이 가져오는 사회적 계층에 따른 차별적인 접근성을 갖게 되어 결과적으로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경관경험의 접근성도 사회적 구성이 낳은 불평등 중 하나라는 것을 암시한다. 즉, 사회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정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오늘날에 주로 자연환경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의 공정한 분배를 주장한다. 공정한 분배와 재분배라는 특성상 이익집단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초점 맞춰지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환경정의의 환경은 자연과학적인 세상의 생태적 환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으로 확장된 개념이다. 자연경관의 상품화도 사회적인 구조로 조밀하게 짜여 있다. 따라서 생태적 환경영향의 정의로움을 환경정의라는 개념을 사용해 논의되어지는 것이라면 사회적 환경 영향의 정의로움도 같은 개념을 사용해 논의되어질 수 있다. 환경정의를 통한 접근은 사회문화적 환경의 포함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즉, 자연경관의 상업화도 "환경정의" 개념 안에 함께 고려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그렇다"로 귀결된다.